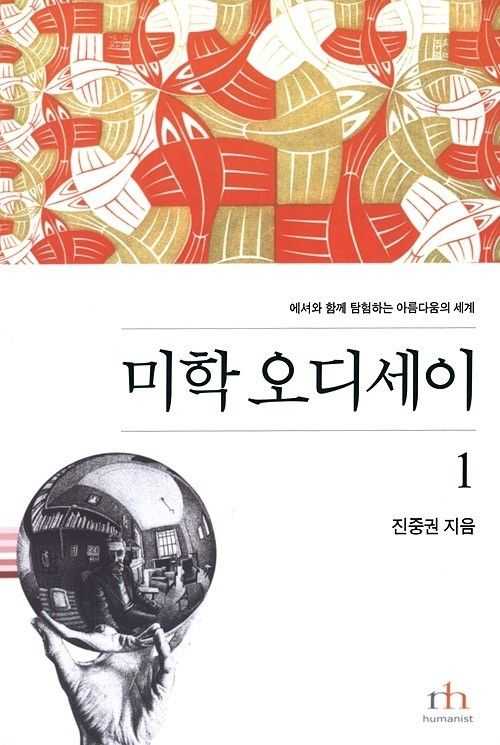16 Highlights
멘델레프는 원소 주기율표를 작성하다가, 칸이 하나 비는 걸 발견했다. 이 칸만 메우면 표는 비례를 이룰 텐데. 여기서 그는 장차 이 빈 칸에 들어갈 새로운 원소가 발견될 거라고 예견했다. 그리고 이 근거 없는 예언은 결국 적중했다. 아인슈타인도 과학적 발견엔 일종의 예술성이 있다고 말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는 연구를 위해 주로 예술적 상상력에 의존했다. 가령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한 건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놓을 경우에 지동설 쪽이 훨씬 더 명확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명석한 관념엔 다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명석’하면서도 ‘판명’한 관념이다. 기하학이나 논리학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명석’하나 아직은 ‘혼연’한 관념인데, 미와 예술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독일의 철학자 알렉산더 바움가르텐(Alexander G. Baumgarten, 1714~1762)은 ‘미학(aesthetica)’이란 말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다.
요즘이야 이성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지만, 사실 계몽의 이념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합리적 사고방식, 자유주의적 정치의식, 개인주의적 생활태도, 이 모든 게 계몽의 산물이니까.
푸생의 꿈은 고대와 르네상스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로크 취향이 유럽을 휩쓸던 17세기에, 프랑스에선 난데없이 고전주의로 ‘리바이벌’이 일어난다. 이는 아마 데카르트 철학과도 관계가 있을 거다. 데카르트는 기하학처럼 명확하고 뚜렷한 지식을 추구했는데, 고전주의 예술이야말로 데카르트 철학의 예술적 구현물이니까. 푸생은 자기가 철저하게 ‘이성’에 따랐다고 믿고 있었다(J’ai des raison pour tout).
다 빈치는 예술엔 반드시 따라야 할 보편적 법칙이 있다고 믿었지만, 미켈란젤로가 보기에 그런 보편적 규칙이란 없다. 미의 법칙은, 가령 물리학의 ‘낙하 법칙’처럼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미와 예술의 법칙은 ‘개별적’이고 ‘일회적’이며, 그때그때 달라진다. 따라서 창작의 법칙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예술가는 법칙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눈의 판단’에 따른다.
다 빈치의 기법 가운데 ‘스푸마토(안개)’라는 게 있다. 인물들을 어스름한 안개로 감싸는 기법인데, 이를 이용하면 아스라한 안개 속에서 형체가 떠오르는 듯한 몽환적 효과를 낼 수 있다.
다 빈치도 창의력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모방과 창의력은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그에게 창의력이란 ‘재현의 규칙을 발견하는 능력’이었으니까. 실제로 그의 작품은 자연 모방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그는 역사상 가장 강한 형태의 모방론을 고수했다.
플로티노스처럼 아우구스티누스도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의 논증은 간단하고 재미있다. 동물들도 모방을 하지만 예술을 갖고 있진 못하다!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던 형상을 실현한 거다. 결국 예술이란 예술가의 발명, 그의 상상력의 산물이란 얘기다. 하지만 자연의 모방이든 내적 형상의 실현이든, 예술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는 ‘거짓’이 아닌가? 아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남을 속일 의도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가령 무언극이나 시는 거짓말로 가득하지만, 그 목적은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하는 데 있으므로, 그걸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배우는 배역상 가장 훌륭하게 속일 때 가장 참되다. 신을 변호했던 것만큼이나 훌륭한 논리로, 그는 이젠 예술을 변호한다.
플로티노스의 독창성은, 이렇게 예술가가 사물의 외관을 모방하지 않고 내면의 형상에 따라 창작을 한다고 본 점에 있다. 사실 이는 아주 현대적인 관념이다. 베네데토 크로체(Benedetto Croce, 1866〜1952)나 폴 수리오(Paul Souriau, 1852〜1926) 같은 현대 미학자들도 그와 똑같이 얘기한다.
하늘에서 신이 기중기를 타고 내려와, 실타래처럼 얽힌 갈등을 해결해주는 거죠. 신이 내려왔는데 해결 안 될 일이 어딨겠습니까? 이 웃기는 수법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 부릅니다. ‘기계 장치를 타고 내려오는 신’이라는 뜻이죠. 에우리피데스가 종종 써먹었죠.
조형예술의 맑고 투명한 정신인 아폴론과, 깊고 어두운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의 정신 디오니소스! 그리스 예술, 아니 인류의 모든 예술이 서로 대립하는 이 두 가지 충동으로 말미암아 발전했다.
가상과 진리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대략 두 가지 노선이 있었다. 플라톤은 예술이 가상을 포기해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가상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악기의 생김새를 보라. 북은 짐승 가죽을 말리던 둥근 틀에 울림통만 갖다붙인 거고, 여러 관악기는 짐승의 뿔이나 바닷가의 고동과 비슷하다. 즉 악기의 원형은 농경, 어로, 수렵, 목축 등의 노동 도구였음에 틀림없다. 회화를 보라. 회화는 원래 의사 소통을 위한 신호에서 나온 거다. 수렵 단계의 구석기 벽화에는 사냥감이 되는 동물만 나타난다. 하지만 농경이 시작되는 신석기 벽화에는 동물 대신에 나무나 농작물, 해와 달처럼 농경과 관계 깊은 자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예술은 유희가 아니라 노동에서 비롯된 게 틀림없는 것 같다.
구석기 시대 원시인들은 아직 개념적 사유가 시지각을 지배할 정도까지 발달하진 않았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개념적 사유’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연을 ‘보이는 대로’ 그릴 수 있었다. 개념적 사유로 무장하지 못한 이 ‘벌거벗은 눈’이야말로 그들의 놀라운 자연주의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구석기인의 ‘높은’ 수준의 자연주의가 그들의 ‘낮은’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설명된다는 역설에 이르게 된다.